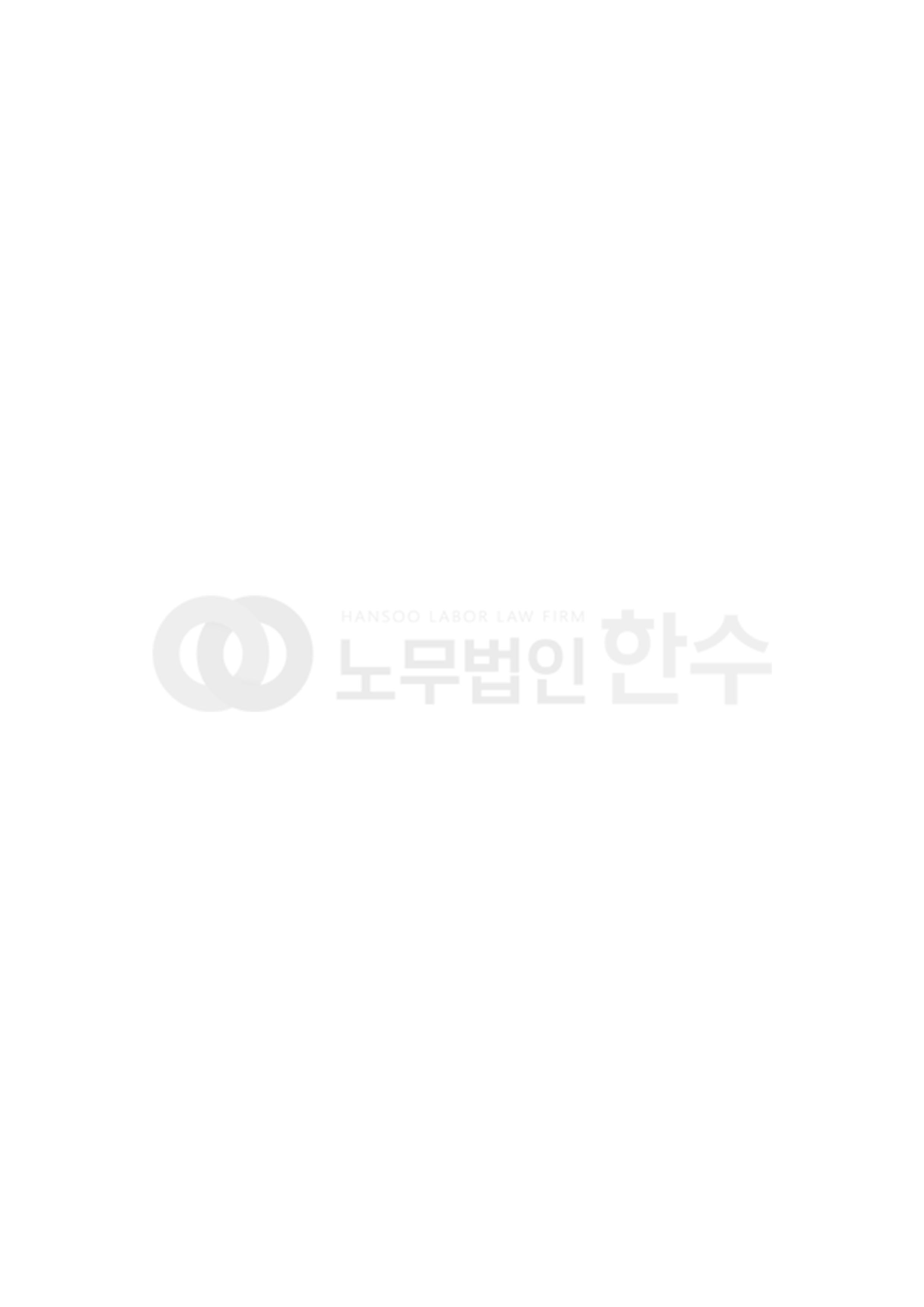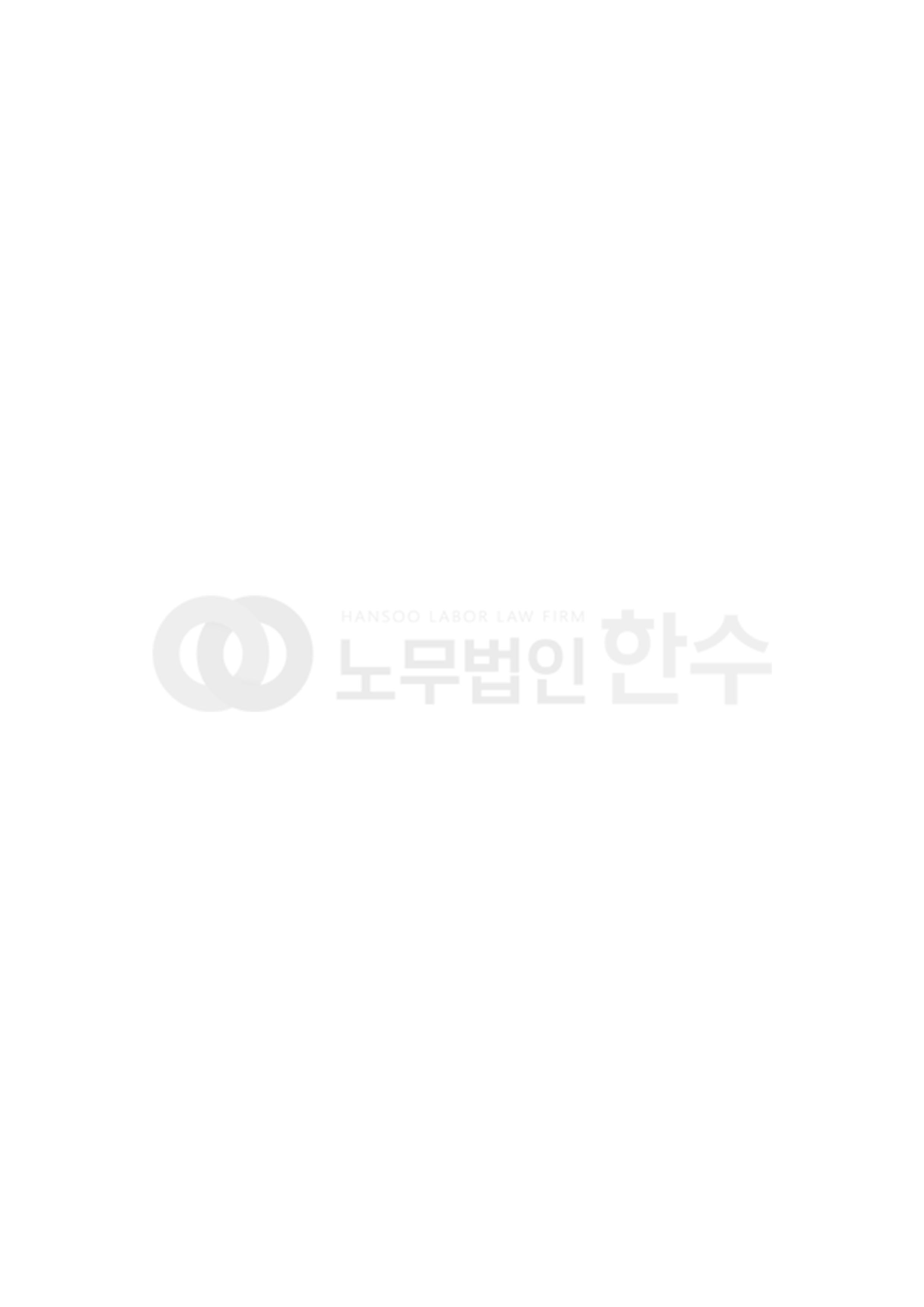Q.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 법률(법률 제10967호, 2012. 7. 26. 시행)에 따라 2012. 7. 26. 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 소득세법에 따라 2012. 12. 31.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아야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 2013. 1. 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받으면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2. 7. 26. ~ 2012. 12. 31. 기간 중 퇴직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1.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IRP로 지급해야 하는지?
2. 그렇다고 한다면,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 법률(제10967호)에 따라 2012. 7. 26.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다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4항과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 7. 26. 이후 퇴직하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에 따라 ①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와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및 ③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2015. 12. 10. 이전에는 150만원)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된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관 부처(국세청)와 협의 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7. 2. 퇴직연금복지과-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