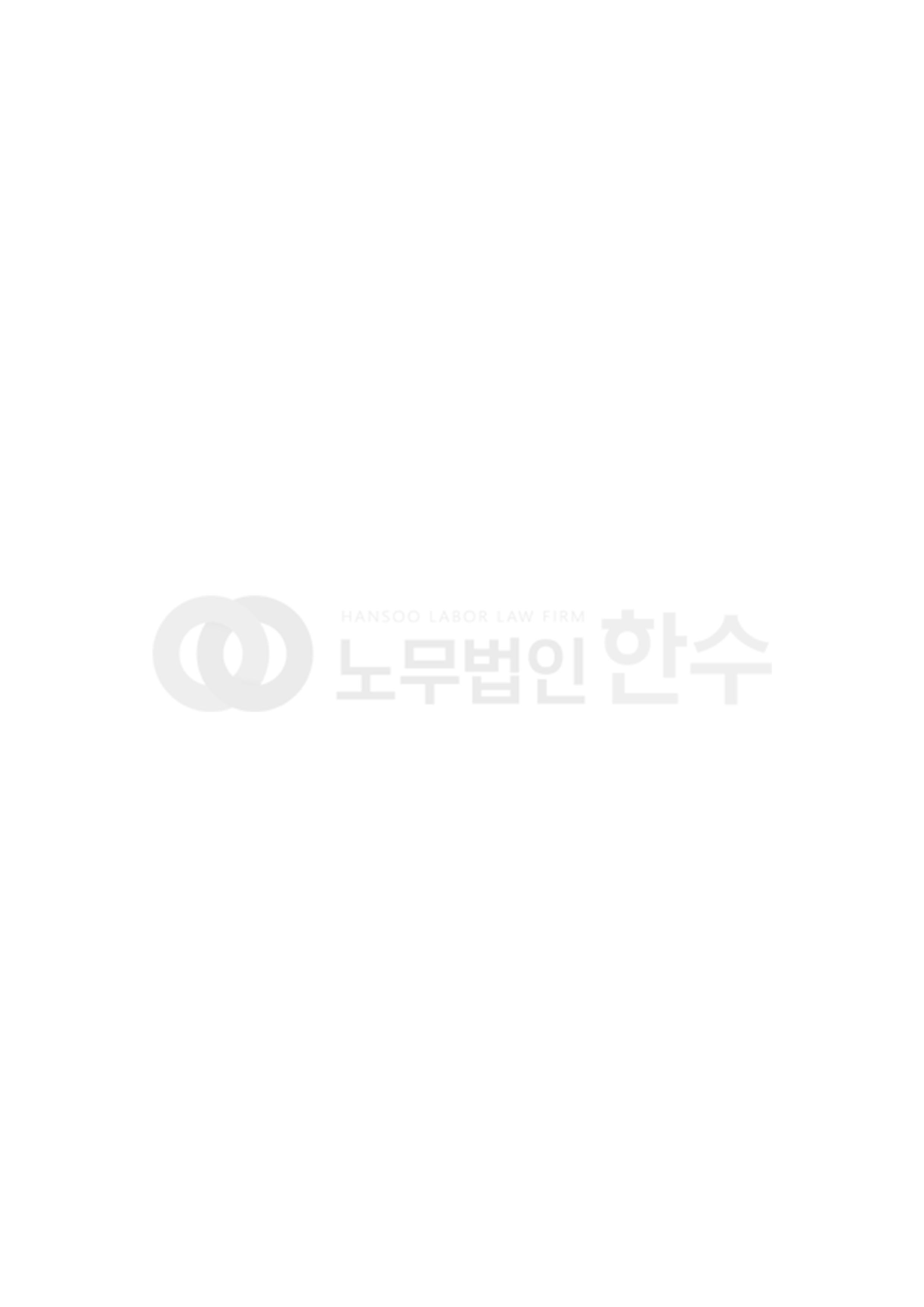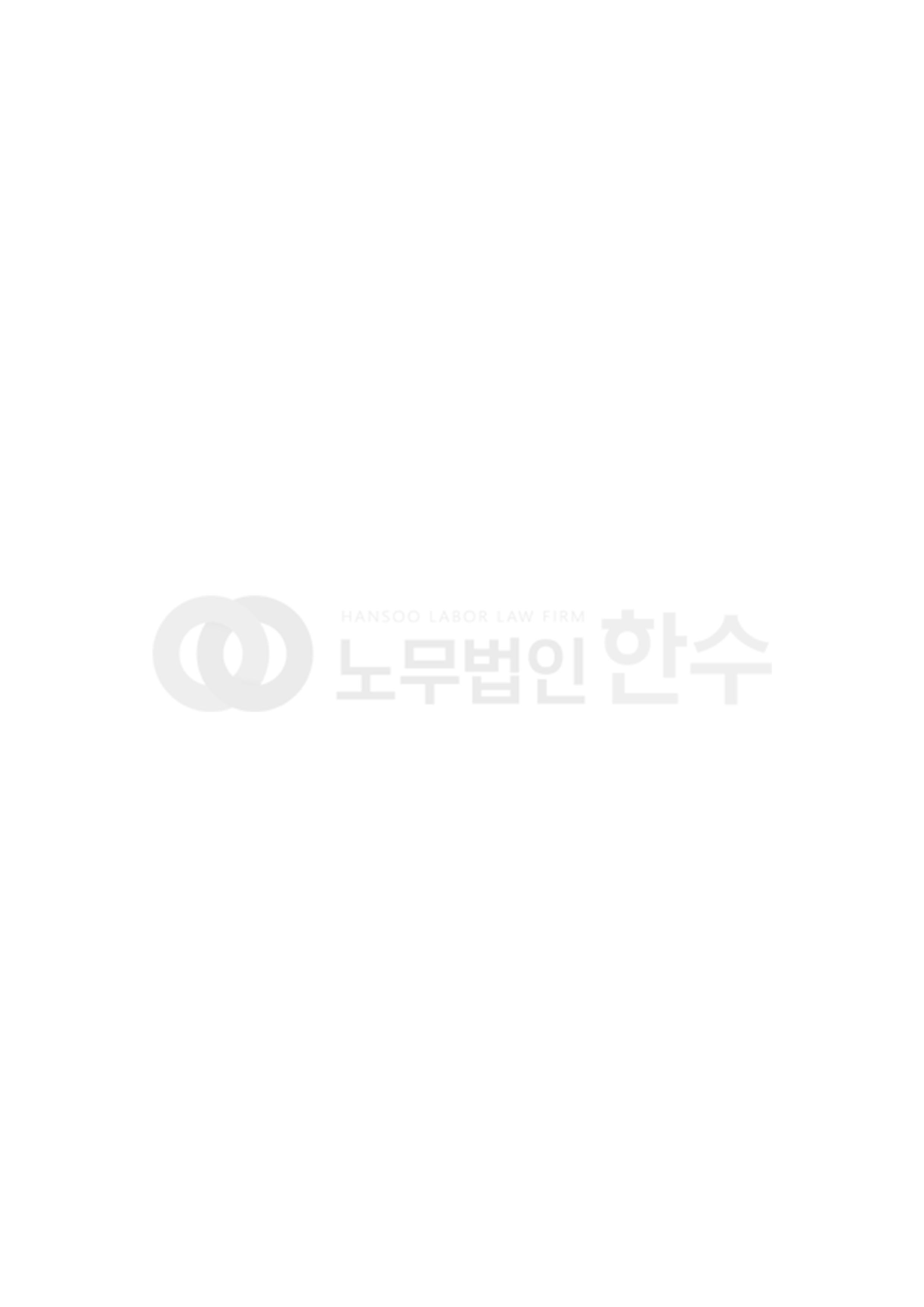Q.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6. 10. 퇴직연금복지과-271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4. 16. 퇴직연금복지과-184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 11. 17. 근로복지과-4289).
2. 한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의할 때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의 전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 때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1)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제1조)과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지급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어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서는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단,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 해당 근로자가 초과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안이라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9. 퇴직연금복지과-182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28. 퇴직연금복지과-1808)
1) 다만, 근로자가 계속해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의 개설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나)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6. 5. 17. 퇴직연금복지과-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