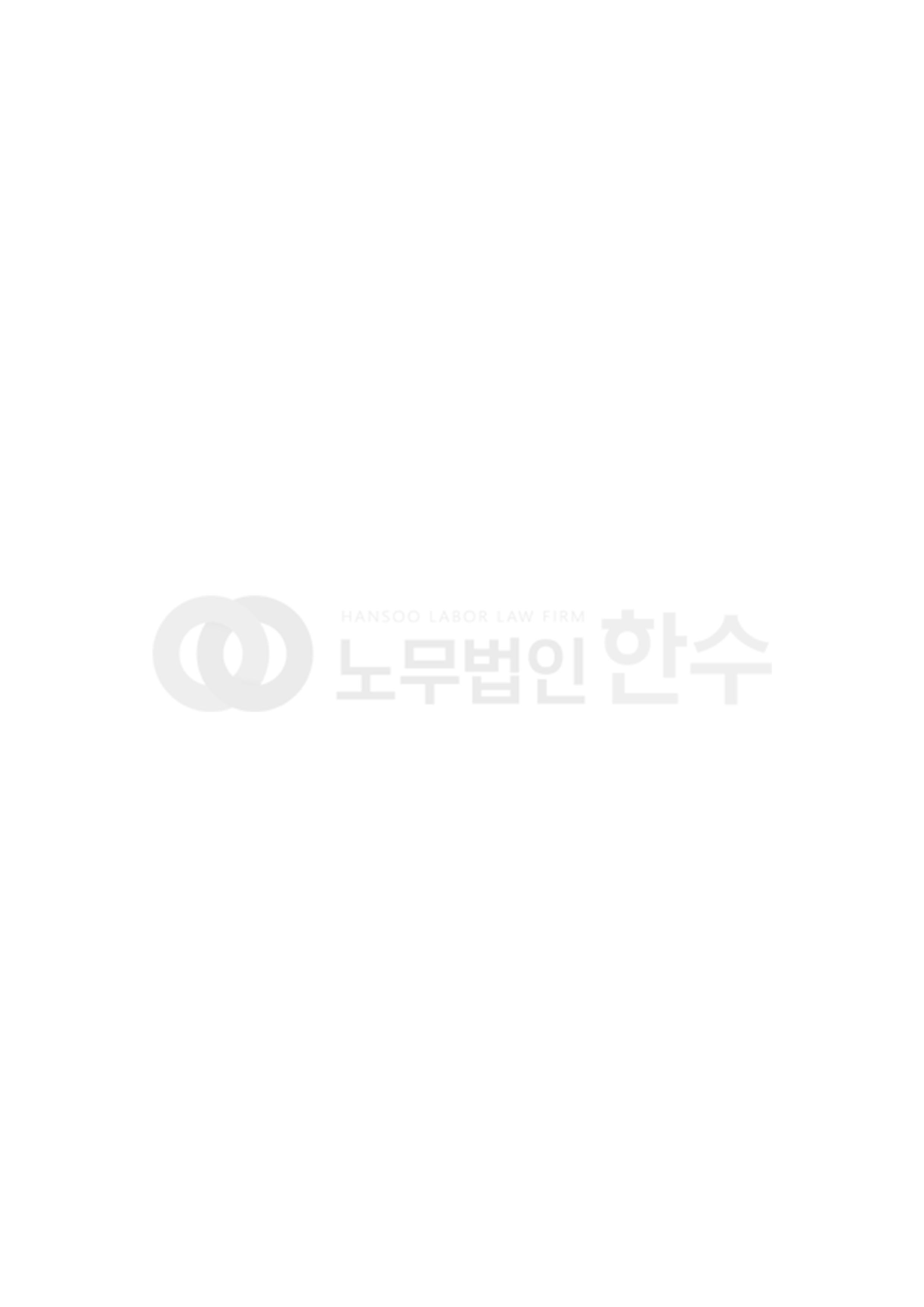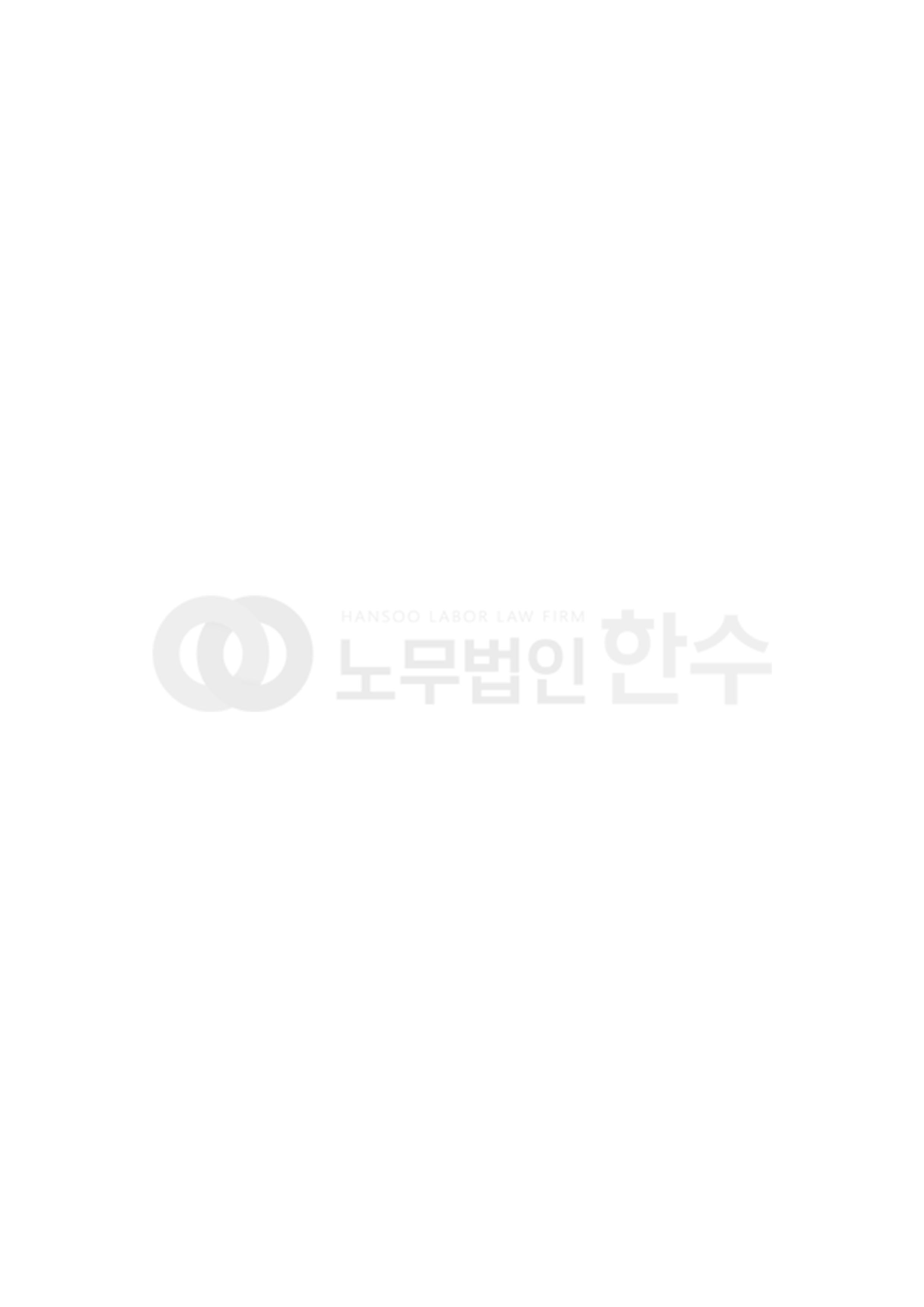Q.
아래와 같은 근무내역을 가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승인받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지?
- 아 래 -
* 병가기간(무급) : 2023. 6. 2 ~ 2023. 8. 21
* 무단결근 : 2023. 5. 19 ~
* 계약 종료일 : 2023. 8. 21
A.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참조)
2.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의 처리방법이 문제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의 급여와 기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1). 그리고 만약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10. 21. 퇴직연금복지과-518 참조). 한편,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되(즉,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기간의 급여와 기간을 분자와 분모에 모두 포함) 위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됩니다.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기간과 무단결근 기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라 먼저 퇴사일 기점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무급병가 기간(2023. 6. 2. ~ 2023. 8. 21.)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므로 결국 무단결근 기간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받은 급여(0원 ☞ 전부 무단결근함) ÷ 퇴직 전 3개월 중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 0원」이 되어 평균임금(0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단, 무단결근 및 병가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경우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중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굳이 병가 시작일 이전의 일부 기간을 끌고 와서 분자와 분모를 인위적으로 3개월로 만든 다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이 전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기간인 경우에는 부득이 병가 전 3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3. 18. 퇴직연금복지과-20031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