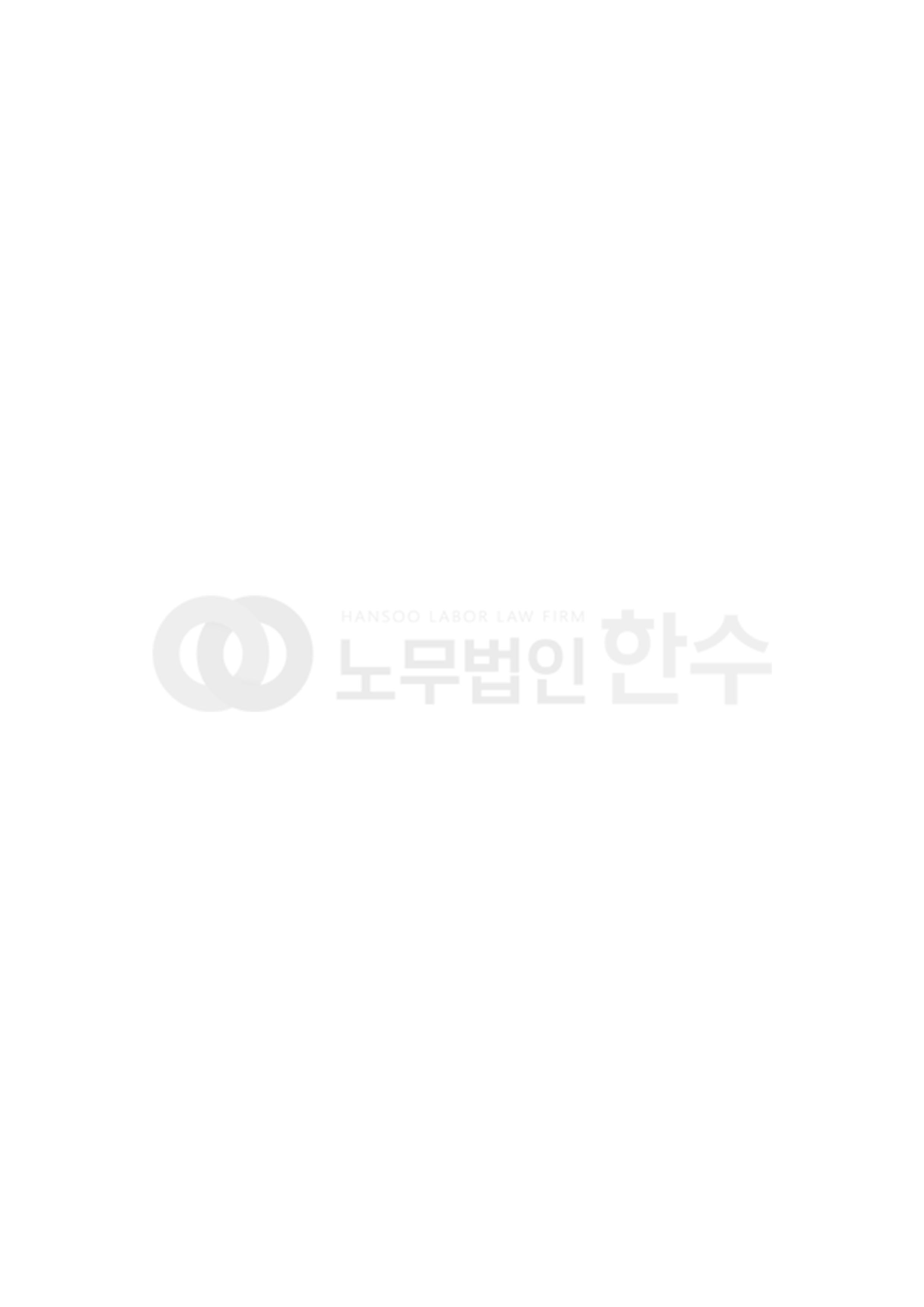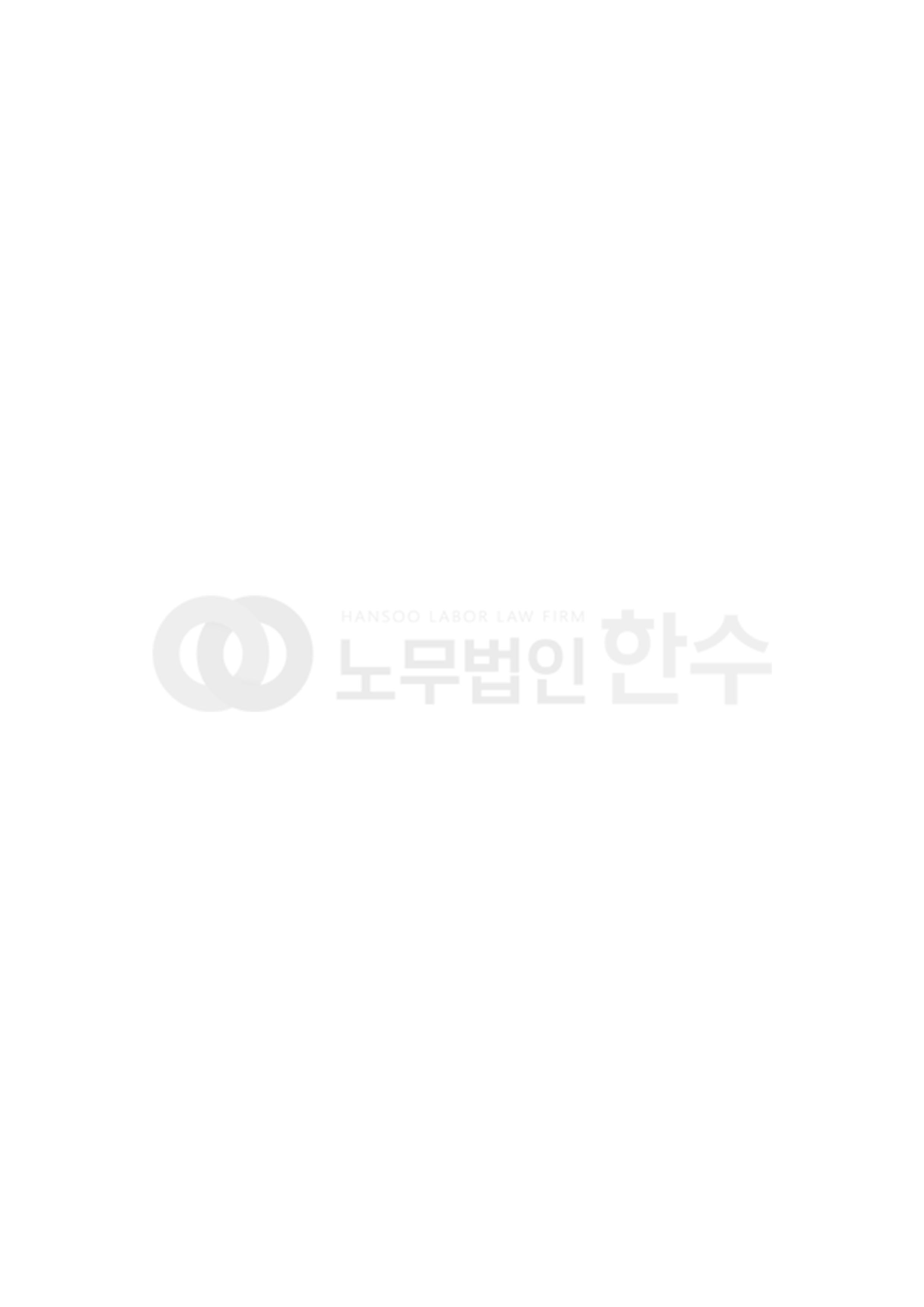Q.
당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여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를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안전근무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할 수 없으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직장 내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근무수칙 등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나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및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에 적정한 양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안전근무수칙 위반 등이 발생한 이유와 전후 경위 및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평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예컨대, 안전근무수칙은 형식에 불과하고 현장근무 당시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또는 현장 반장 등이 근무수칙 위반을 알고도 오랫 동안 묵인하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오히려 안전근무수칙 위반을 조장해온 경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및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징계사유가 밝혀지더라도 그 사유와 징계처분 간에는 적정한 양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참조) -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7조 참조).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피재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안전근무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와 별개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단체협약 등에서 산업재해의 피재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록 해고가 아닌 징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해고 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즉,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심신을 회복한 다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처리 방향이라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이와 같은 경우에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시효를 두고 있다면 그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징계를 하는(또는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